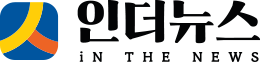언론계 입문을 위한 지상 특강. 국내 유일, 국내 최다 12만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언론고시카페-아랑>의 운영진의 협조를 받아 <인더뉴스>의 청춘 독자들께 촌철살인 언론사 취업팁을 전합니다. [편집자주]
[아랑카페 운영자] “저는 기자를 지망하고 있지만, 뉴스 앵커에도 관심이 있어서 아나운서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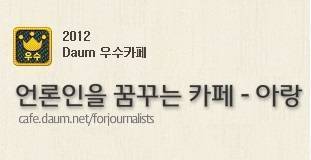 후배들과 멘토링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다. 사실 거짓말이다. 지원 해보라고 하면 아나운서 쓴다. 막상 기자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 앵커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나운서 시험장에서 포부를 말해보라고 하면 아나테이너가 되고 싶다는 둥,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나운서들의 이름을 줄줄 꿰고 있는 등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후배들과 멘토링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다. 사실 거짓말이다. 지원 해보라고 하면 아나운서 쓴다. 막상 기자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 앵커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나운서 시험장에서 포부를 말해보라고 하면 아나테이너가 되고 싶다는 둥,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나운서들의 이름을 줄줄 꿰고 있는 등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정작 기자를 할 생각도, 노력도 없다. 그렇다면 기자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이유는 사실 뻔하다. 방송국에는 가고 싶으니깐, 방송국에 못가겠다면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기자라는 타이틀, 언론인으로 묶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에도 신방과를 나와서 ‘안전빵’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다.
사실 2008~2009년정도까지만 해도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다.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기자 준비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의 한 지인도 아나운서 지원을 3년 정도 하다가 기자를 하겠다고 지망을 바꾼 뒤 2년 정도 꼬박 고생을 하고 간신히 기자가 됐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명문대 출신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늘어나고, 아나운서 지망생들의 필기시험 과목, 예컨대 논술과 작문, 상식 등에 있어서 실력이 좋아지면서 아나운서를 준비하다가 덜컥 기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2011년 이후 종편 개국과 함께 기자 문호가 넓어지면서 아나운서 지망생들 중 필기 공부를 덜 한 경우에도 합격을 하는 경우가 꽤 목격됐다.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기자로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세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나운서는 방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중심이다. 예능에서는 MC, 교양에서는 진행 또는 내레이션, 뉴스에서는 앵커가 된다.
하지만 기자는 철저히 회사의 구성원이 돼야 한다. 하나의 뉴스를 만들기 위한 부분 격인 리포트를 만들거나, 앵커와 대담을 통해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방송기자의 업무다. 리포트를 뜯어본다면, 섭외에서 기사 작성, 편집 및 촬영기자와의 협업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취재기자의 외근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주목받는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지망생들이 기자 생활에 적응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사교양PD와 기자를 함께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사교양 PD를 꾸준히 준비해 합격 후 현직 또는 장수생이 되거나 합격하는 곳의 기자가 되는 경우 등의 케이스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다. 필자의 지인 중에서도 아나운서를 몇 년 씩 준비하다가 신문기자로 대성한 사람들이 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예외라고 비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시사교양 PD를 꿈꾸다가 기자로 입사한 뒤, 1년 후 시사교양PD로 입사한 케이스도 있었다. 지방 MBC 기자를 하다가 아나운서로 전직한 경우도 있었다.
최악의 케이스는 예나 지금이나 이것 하나다. 아나운서를 꿈꾼다면서 공부와 실기 모두를 게을리하고 있다가, 나이는 차고 딱히 합격도 못 한 상황에서 대학원에 가는 경우다.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변변히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