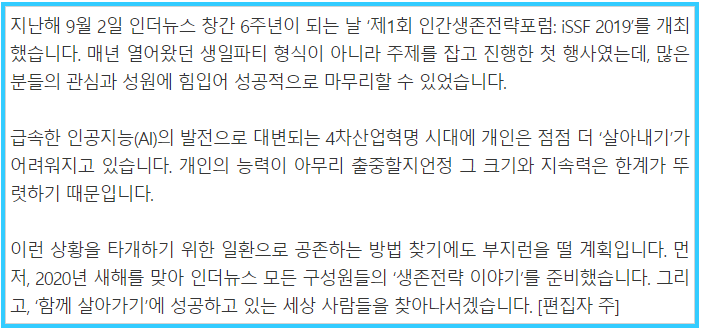
“너 회사 언제 만들었지?”
“2013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6년이 넘었네요. 생존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야, 그래도 대단하다. 이 불경기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용하지.”
“회사 규모가 나름 커지긴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합니다.”
간혹 지인들과 나누게 되는 대화의 패턴입니다. 그러다 결론을 이렇게 맺곤 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가장(家長)이 되는 거였는데, 여전히 가장은 못 되고 사장질을 하고 있네요.” 스스로에 대한 푸념이기도 하지만, 나름의 안도감이 담긴 표현이기도 합니다.
‘FFM 2023’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시작한 인더뉴스 설립과 운영의 1차 목표 시점이 불과 4년도 남지 않은 때가 왔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정도만큼은 항해 중인 것 같아서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든든한 울타리에서 벗어나 6년 넘게 생존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생존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오래 벌어야 산다

회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때가 39살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살 이후로 회사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마흔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60살까지는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 다음은?’
원래는 45살 때쯤 독립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마침(?) 회사의 분위기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5년을 앞당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50살 이후로는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도록 하자.’
독립하겠다는 계획을 주변에 얘기해 보니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년 안에 망하는 회사가 부지기수다. 다시 생각해 봐라.”, “뜬금 없이 웬 보험매체(*최초에 3년 동안 인더뉴스는 보험전문매체로 운영됐습니다)를 만든다는 거냐?”
구구절절 말씀드리기가 뭣한데요. 인더뉴스가 얼마나 커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망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외형적인 규모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대신 내실을 키우는 데에는 관심이 있긴 합니다.)
◇ 창간경험을 썩히지 말자
자의(自意)로 많은 매체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 윗사람들과 불화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위에 아무도 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창업의 길로 이르게 된 큰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서 일을 하게 된 덕에 창업(창간) 작업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신문, 의료정보 웹사이트, 월간지, 2인 방송사 등을 초반 기획작업부터 시작, 매체를 만들고 난 뒤에 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더뉴스를 만들기 직전에 일했던 매체에서는 순수하게(?) 기자일만 했었는데요. 인터넷 경제신문이었던 회사가 타블로이드판 경제신문을 창간했고, 이어 1년 뒤에는 대판(보통의 일간신문 형태) 신문을 만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창간의 경험을 또 쌓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간혹 꺼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거의가 “창간전문 기자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창간을 했죠. 저런 귀한 경험을 썩히고 있으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겠어요?”라고 응수합니다.

◇ 플랜 E쯤은 있어야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에서 창업과 관련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가 “왜 보험전문지를 만드는 거야? 플랜 B는 가지고 있어?” 물어왔습니다. 제가 내어놓은 답은 “겨우 플랜 B만? A부터 E까지.”였습니다.
사실, 기자로 보험 분야를 경험한 게 6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전문 매체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체를 창간해 본 경험은 꽤 있지만, 회사를 만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잘 될 가능성보다는 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입니다.
친구에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내가 잘 했던 분야의 매체를 만들었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 수순이 없다. 하지만, 잘 모르는 분야에서 실패하면 그간의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잘해왔던 분야의 매체를 다시 만들어 볼 수 있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생존에 성공하면 자신이 있는 분야로 확장은 더 쉬워지지 않겠냐?”
친구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플랜 B는 고사하고, 사업계획 자체를 제대로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넌 학교 다닐 때에는 대충대충 사는 것 같더니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치켜세워 줬습니다.
- 플랜 A: 보험전문 매체로 시작해 경제신문으로 유연하게 확장.
- 플랜 B: 보험전문 매체로 시작해 경제신문으로 공격적으로 확장.
- 플랜 C: 보험전문 매체로 한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
- 플랜 D: 일단 철수 후 경험이 많은 분야의 매체를 다시 창간.
- 플랜 E: 귀향 후 ‘문 기자 논술학원’ 운영.
미리 세워 놓은 계획은 대략 이런 건데요. 아직까지 플랜 A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고, 주변의 시각도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공존(共存)’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 곳이기 때문인데요. 회사 내외부에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하고 시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 하고 있다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만,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추억을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의미와 재미가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계속 시도하다 보면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생기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