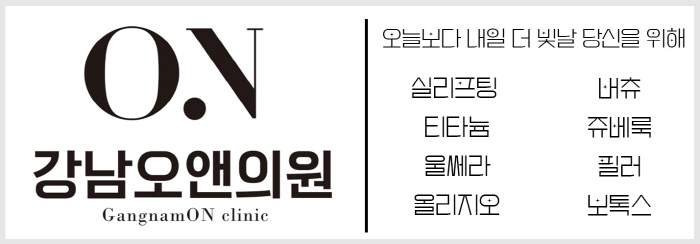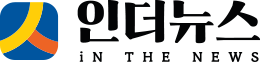[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생명보험사의 설계사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최근 출시된 여성전용 종신보험을 판매하던 중에 만난 계약자 B씨와의 일 때문이다. 남편과 별거 중인 B씨는 보험계약과정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중학생인 딸로 지정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딸 C로 지정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친권자(남편) D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남편에게 보험계약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은 B씨는 수익자 지정 때문에 계약을 망설였다. 설계사 A씨는 보험수익자 지정을 설명한 것에 대해 후회스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이달 1일부터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를 지정할 때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수익자 지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해 놓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부양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혼 부모가 보험 수익자(법정 상속인)가 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사망자들이 가입해 놓은 보험(금)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사정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수익자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수익자 지정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상황이다. 보험계약과 관계된 주체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구성되는데, 수익자를 지정하려면 본인(수익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이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의 원치 않는 개인정보 누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남편과 별거 중인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계약자(엄마)가 미성년자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친권자(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엄마는 보험가입 사실을 자녀에게만 알리고 싶어도, 남편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모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고객 중에는 자신의 보험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수익자 지정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제 3자)에게 계약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보험 수익자 지정’이 더 외면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영업현장에서는 수익자 지정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더 번거로워져 권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의 생보사 설계사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수익자가 미성년자든 아니든 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기가 번거로워져 수익자 지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의 설계사는 “보험 수익자 지정은 ‘보험금 지급이라는 보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장치”라며 “하지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보험의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수익자 지정은 선택사항이지 필수는 아니다. 이 때문에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 비중은 평균 19.9%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보험계약의 사행성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의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역을 넘어 민법 영역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