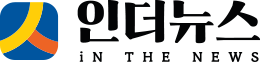[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기업 또는 거액의 자산가들이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은행계좌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총 예금 규모(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성예금)는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계좌의 총예금만 499조1890억 원에 달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33조3160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증가세가 더디거나 감소한 해도 있었다. 2011년 말에는 373조6400억 원을 기록했고, 2012년 말에는 376조9370억 원으로 3조297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3년 말(362조8260억 원)에는 전년도에 비해 14조1110억 원으로 뒷걸음 쳤다.
이후 2014년에는 399조40억 원으로 껑충 뛰다가 2015년 35조5540억 원, 2016년 30조3150억 원, 2017년 33조3160억 원을 기록해 4년 연속 10%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뭉칫돈 계좌의 예금액 증가세는 좀 더 작은 규모 예금계좌의 증가세에 비해서도 빨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계좌의 예금액 증가율은 7.2%로 전체 저축성예금 증가율(4.7%)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각각의 액수별 증가율은 1억 원 이하 3.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3.2%,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1.1%에 머물렀다. 예금액 계좌수는 지난해말 기준 10억 원 초과 총 6만2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에 비해 2000개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행 통계조사국 관계자는 “거액 계좌의 주인은 일반 자산가도 있고 법인 자산가도 있다”며 “쌓인 액수 원인은 정확히 분석은 어려우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짐작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자산이 해마다 쌓였다는 것은 자금이 생산적으로 흘러가지 못 했다고 해석했다. 보통 경제규모가 커지면 금융사이즈도 늘어나 미래투자환경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경기 불확실 등 리스크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자현 KDI 한국금융연구개발원 박사는 “그간 금융회사들은 부동산·가계대출로 운용해 왔는데,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위축돼 생산적 측면은 보지 못 한 것”이라며 “쌓인 자산은 향후 금융 혁신적 성장에 맞게 투자에 유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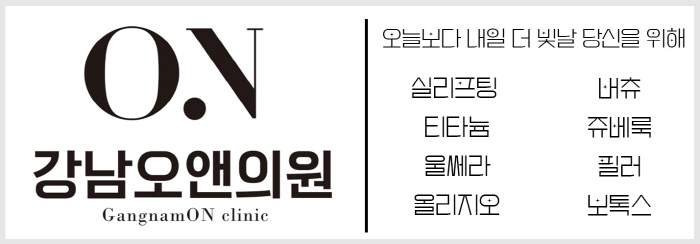


![[실적발표 후 UP & DOWN] “기아, 3분기 이익부진 불구 목표가 상향”…배경은?](https://www.inthe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1543309021_7f8e8b_120x9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