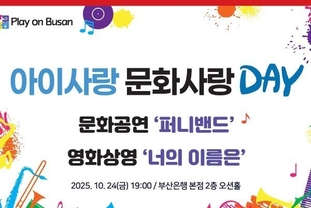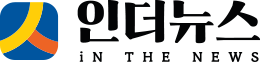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 연구진이 3D 바이오프린팅을 활용해 내분비 활성 지방 조직을 제작하고 이를 피부 조직과 결합해 재생 효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의생명융합공학부 김병수 교수 연구팀이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내분비 지방 조직을 조립하고 이를 피부 조직과 결합해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월 2일자에 게재됐습니다.
지방 세포는 사이토카인(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 신호물질)을 분비해 주변 조직과 상호작용하며 대사 항상성과 조직 재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기존 조직공학 기술로는 지방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피부 및 근육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조직 제작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지방 조직의 내분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피부 조직과 결합할 수 있는 조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지방 조직을 레고 블록처럼 모듈 단위로 제작하고 피부 진피층과 결합하는 방식을 도입해 조직 통합성을 높였습니다.
연구팀은 내장형 3D 바이오프린팅(embedded 3D bioprinting) 기법을 적용해 지방 조직 단위를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바이오잉크 조성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지방세포 배양 방식에서는 세포가 주변으로 이동해 밀집된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알지네이트(alginate)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바이오잉크를 활용해 세포 이동을 제한하고 밀도를 높였습니다.
연구 결과, 0.5% 알지네이트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바이오잉크에서 지방 세포의 밀집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방 세포의 성숙을 촉진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 단위의 크기를 최적화한 결과, 600㎛에서 지방 세포의 생존 및 성숙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 조직이 피부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팀은 3D 프린팅 기반 맞춤형 상처 치유 플랫폼을 제작했습니다. 실험 결과, 지방 단위가 포함된 환경에서 피부 세포(섬유아세포 및 각질형성세포)의 이동 속도가 증가해 16시간 내 80% 이상의 상처 폐쇄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방 단위 간 간격이 1000㎛일 때 세포 이동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누드 마우스(nude mouse) 모델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지방 단위가 포함된 모듈을 피부 손상 부위에 이식한 결과, 혈관 형성이 증가하고 표피 재생이 촉진됨이 확인됐습니다. 레이저 도플러 혈류 이미징(LDPI) 분석에서는 혈관 생성이 증가해 혈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면역조직화학 분석에서는 혈관 생성 마커(CD31) 및 표피 형성 마커(K10, involucrin)의 발현이 증가해 피부 재생이 활성화됨이 입증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내분비 기능을 갖춘 지방 조직을 3D 바이오프린팅을 이용해 제작하고, 이를 피부 조직과 정밀하게 결합하는 어셈블리 전략이 기존 조직 공학적 접근법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재생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김병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지방 조직의 내분비 기능을 활용해 피부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기술이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분야에서 지방 조직뿐만 아니라 다기능성 인공 조직 제작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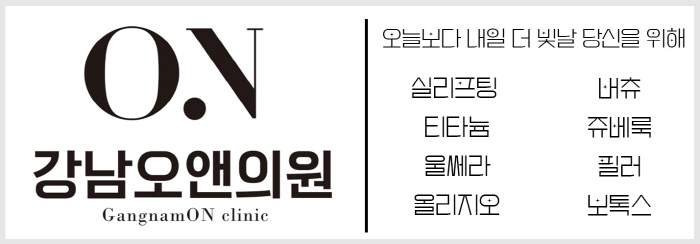



![[3분기 실적] 대한항공, 외부 변수에 ‘난기류’…4분기 반등 노린다](https://www.inthe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0322680568_5c20b0_120x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