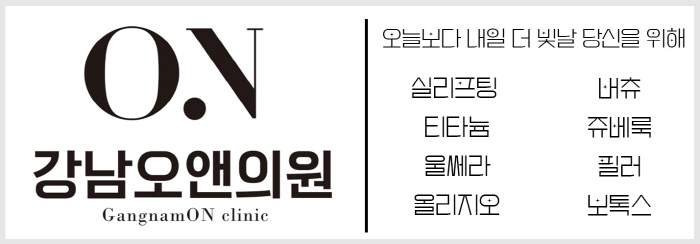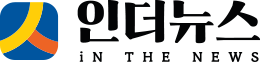[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핀테크(Fintech)의 발전이 금융업권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금융산업 일자리는 꾸준히 현상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업종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핀테크산업 확대와 사회적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금융산업이 최근 3~5년 동안 혁명적으로 AI, ICT 등을 도입해 점포나 일자리가 감소된 게 아니다”며 “은행산업 포화와 시장 경쟁, 수익구조 다변화 등 산업구조와 경영전략적인 요인도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이 제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실제로 지난 10년(2009년~2018년)간 금융산업 일자리는 꾸준하게 현상 유지 혹은 오히려 증가한 업종도 있다. 5인 이상 금융업 종사자는 2009년 상반기 23만 3731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25만 4897명으로 약 2만명 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험 및 연금업’ 종사자는 2009년 상반기 10만 2704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10만 794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종사자도 2009년 상반기 6만 7435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10만 3887명으로 3만명 이상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일자리의 10년 추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부소장은 “정규직 중심 금융인은 줄었지만 백오피스 직원은 늘어났고, 은행도 텔러는 줄었지만 아웃소싱 측면에서는 증가했다”며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공포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미 30년 전부터 ATM이 등장하는 등 압박은 꾸준히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오히려 핀테크 등 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포용적 로봇(inclusive robot)’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는 기술을 인간의 대체가 아닌 인간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부소장은 “이러한 목표는 기술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목표”라며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수반되지 않은 자본 편향적 기술 변화는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기술 통제, 노동 강도 강화, 자율성 저하 등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