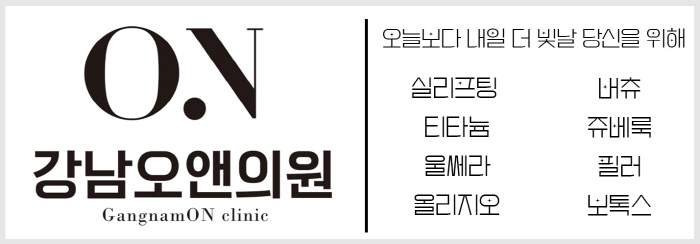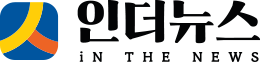[아랑카페 운영자] 언론계 입문을 위한 지상 특강. 국내 유일, 국내 최다 12만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언론고시카페-아랑>의 운영진의 협조를 받아 <인더뉴스>의 청춘 독자들께 촌철살인 언론사 취업팁을 전합니다. [편집자주]
 스펙에 대한 구직자들의 볼멘소리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합격자와 자기 자신의 공통점 중 ‘열등 요소’만 찾고 있으니 합격에서 멀어진다.
스펙에 대한 구직자들의 볼멘소리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합격자와 자기 자신의 공통점 중 ‘열등 요소’만 찾고 있으니 합격에서 멀어진다.
예컨대, 지상파 방송에 재직 중인 한 PD가 강연에서 자신은 토익 점수가 700점대였는데 최종합격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강연을 들은 PD지망생 중 상당수는 ‘700점대 토익점수’ 딱 이 말만 기억한다. 그 PD가 기획안을 얼마나 잘 쓰는지, 다큐대회에서 입상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의 요소는 관심도 갖지 않는다. 자신과 같은 저(低) 스펙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고 자위한다.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대 출신이 합격했다고 하면, 수도권대를 나온 학생들은 그냥 안심하고 들어간다. 그 지방대 출신 현직자가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연구하지 않고 말이다. 이전에 한 신문사에서는 기혼 여성이 합격했다면서 지망생들 사이에서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가 서울대 수석 졸업을 했다는 팩트는 잘려나간 채로 말이다.
마찬가지로 토익 900점이 안 되는 합격자들의 이야기도 수험생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확인 결과 두 명의 점수는 890점이었는데, 한 사람은 제2외국어를 탁월하게 잘했고 다른 한 사람은 전(前)직장 경력이 화려했다. 이런 맥락은 다 자르고 ‘900점이 되지 않아도 합격한다’는 이야기가 도는 셈이다.
스펙에 대한 논의는 딱 한 가지 단어로 귀결할 수 있다. 상.대.평.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자신이 언론인으로서 더 가능성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영어 점수가 부족하다면 명문대 출신 지원자보다 시험을 더 잘 보거나 외국어 능력이 탁월하면 만회될 수 있다. 학점이 낮다면 다른 성적을 높일 수도 있겠다. ‘지원자의 경쟁력’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보면 오히려 논의가 명쾌하다.
그렇지 않고 “나랑 쟤는 토익 점수가 같은데 왜 쟤가 됐느냐. 백(배경)이 작용한 것 같다”는 식의 신세한탄을 하거나, 운칠기삼(運七技三) 같은 소리나 떠들고 있으면 합격은 물 건너간다. 그럴 시간에 논술 한 편 더 써보는 것이 백배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