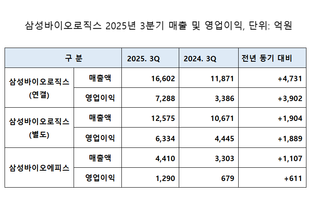정은정 농촌사회학자ㅣ10여 년 전쯤, 내가 태어난 집에 찾아가 보았다. 어릴 때 떠나와 고향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은데도, 태어난 자리에 찾아가 생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을 우연히 따른 날이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당시의 기억을 가질 수 없고, 가족과 친지, 이웃들의 말에 의지를 해야 한다. 나는 우연히 인터넷 항공지도로 내가 태어난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즘은 집에서도 온갖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어서 생의 흔적을 찾기는 더 수월하다. 인생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 보니 프린터에서 쉬지 않고 서류가 쏟아져 나왔다. 40대 중반 나이에 도합 스무 번이 넘는 이동 기록이 남아있다. 그렇게 태어난 집을 찾아 사진도 한 장 찍어 간직해 두었고, 내가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헐렸다.
주민등록등본에 남아있는 이사의 이력은 한 가족의 생애사를 압축해 놓은 것이기도 하다. 충청도에서 서울로 떠나와 평균 2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한 셈이다. 짧게 살았을 때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한 적도 있다. 지금은 전세 계약이 2년이지만 80년대만 해도 1년이 계약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엄마는 주인집이 신경 쓰여 발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다니라 다그치기도 했다. 고향에서 동네 이사를 할 때는 대체로 들뜨고 설레기도 했었다. 트럭 뒤에 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고, 좀체 뭘 사 오는 일이 없는 엄마가 박카스 같은 드링크류를 사서 이사를 도와주는 이웃들에게 돌리기도 해서 그 우수리가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사를 끝내자마자 엄마는 팥시루떡을 쪄서 골목길 가까운 집에 돌리곤 했다. 그 심부름은 나와 작은언니의 몫이었다. "엄마가 이사 떡 갖다 드리래요." 라는 대사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빈 접시에 사탕이나 과일 등속을 얹어 다시 받아오는 재미도 좋았다.
하지만 그런 이사의 재미는 서울로 오면서 끝이 났다. 일곱 살 되던 해에 서울로 이사를 올 때는 트럭이 아니라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엄마 무릎에 앉아 맨 뒷자리에 앉아서 왔는데, 호된 멀미를 해서 얼굴이 누렇게 뜬 채로 서울 마장동 터미널에 내렸다. 그렇게 멀미와 함께 팥시루떡 돌릴 일도, 박카스를 나눠 먹을 일도 없이 서울로 떠밀렸다.
서울에서 오래도록 셋방을 전전하다 보니 주인집 사정에 묶여 우리집 사정은 더욱 출렁댔다. 딱 한 번 좋았던 주인집은 아들 내외에게 우리가 살던 집을 내주는 바람에 갑작스레 나온 적도 있었다.
등본 주소만 보아도 어떤 이사를 했었던 것인지 고스란히 떠오른다. 아무리 어렸어도 부모님의 한숨이란 어린애의 심장에 박히는 일이니까. 잘 풀려서 가는 이사는 거의 없었다. 농촌 출신의 부모님이 더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는 난망하고, 자식들은 머리가 굵어져 교육비도, 식비도 더 들어갔다. 몸집이 자란 자식들은 자기 방을 내달라 아우성쳐도 수도권의 부동산값은 언제나 사람보다 발이 빨라 저 멀리 내빼기 일쑤였다.
살림을 줄여가거나 지하로 내려가거나 하는 이사가 많아서 분위기는 늘 가라앉아 있었다. 이사 때마다 인근에 사는 삼촌과 사촌 오빠들이 와서 힘을 보탰다. 지금처럼 포장이사도 없던 시절이고 설사 있었다 한들 비싼 포장이사를 했을 리 만무하다.
신문지를 모아 그릇을 싸고, 단골 상회에서 종이박스를 얻거나 돈을 주고 사기도 했다. 정육점 고기를 묶을 때 쓰는 분홍 나일론 끈으로 책을 묶었다. 용달차 기사는 짐이 너무 많다며 트럭 한 대는 더 불러야 한다며 짜증을 냈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짐을 높이 쌓아 묶으면 되지 않냐며 짐을 욱여넣으니, 어린 나는 주눅이 들었다.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 했고, 아직 살림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여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도 없었다. 가스 연결도 하루는 지나야 했고, 전화 개통도 2~3일은 기다려야 했던 때였으니까.
지금은 팥빙수 한 그릇, 커피 한 잔도 배달을 시켜 먹지만, 오래전부터 배달음식은 오로지 중국음식이었다. 무엇보다 아직 풀지도 못한 짐짝 위에서 먹기엔 짜장면이 제격이다.
대강 집 한 귀퉁이를 치우고 신문지 위에 짜장면을 올려놓고 먹으면 그렇게 한 끼가 해결되었으므로 이삿날에는 짜장면이라는 공식이 생긴 것이 아닐까. 짬뽕까지는 허락되지만 탕수육 같은 것들은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나마 여러 그릇 시킨다고 군만두 서비스라도 주면 감지덕지였다.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집의 군만두의 질이 떨어졌다 한탄하는 이들도 많지만, 살림 줄여나가는 서글픈 이사에 그런 서비스 군만두라도 없었으면 더욱 서글펐을 것이다. 모든 튀김 요리는 이름 붙은 날, 좋은 날에 먹는 음식이니까.
평소에는 허덕허덕하던 짜장면이지만 어린아이 눈에도 형편 꼬여 가는 이사인 것이 빤해, 이삿날 짜장면이 맛있지 않았다. 이삿날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없어서인지 지금도 이삿날 짜장면 먹는 일이 어쩐지 서럽다.
지난주 이사를 했다. 수도권의 전세값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조금 더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왔다. 집 앞은 소음과 먼지가 날리는 공사판이지만 그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싼 전셋집을 낚아채서 묵은 살림을 옮겼다. 세입자로 살면서 받는 최고의 스트레스 중 하나가 이사 스트레스지만 또 어떻게든 삶의 자리는 옮겨지게 마련이다.
대충 짐을 부려놓고 의례를 치르듯 중국요리를 시켰다. 그 시절 엄마는 탕수육 소(小)자 한 개 안 시켜주고, 심지어 짜장면 곱빼기 하나로 나와 작은언니는 나눠 먹으라 해서 우리를 더욱 서럽게 했지만, 이번에는 유산슬에 빼갈도 하나 시켰다. 일인 일 짜장! 일인 일 짬뽕! 삼선 짜장도 오케이! 먼 옛날 짜장면 곱빼기를 언니와 서럽게 나눠 먹던 어린 나를 토닥거리면서, 탕수육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 호기롭게 외쳤다.
"여기, 짜장 둘, 짬뽕 하나, 유산슬 하나, 빼갈도 추가요!"
■정은정 필자
농촌사회학 연구자. <대한민국치킨展>,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뿌리다 – 백남기 농민 투쟁 기록>,<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 등을 썼다. 농촌과 먹거리, 자영업 문제를 주제로 일간지와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에 나가 농촌과 음식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도 겸하고 있다. 그림책 <그렇게 치킨이 된다>와 공저로 <질적연구자 좌충우돌기>, <팬데믹시대, 한국의 길>이 있고 <한국농업기술사전>에 ‘양돈’과 ‘양계’편의 편자로 참여했다. +






![[iN The Scene] 이억원 금융위원장 코스피 4000 돌파 “새로운 도약 출발점”](https://www.inthe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4/art_17615676200702_514d97_120x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