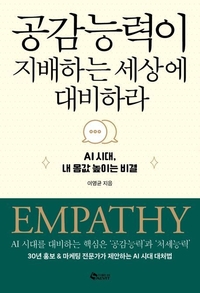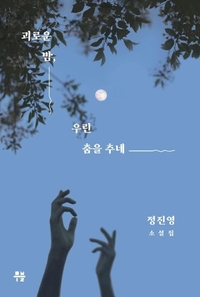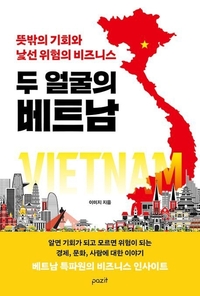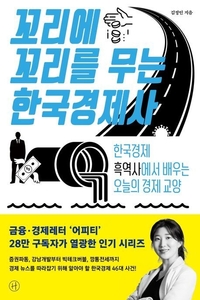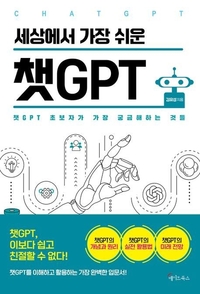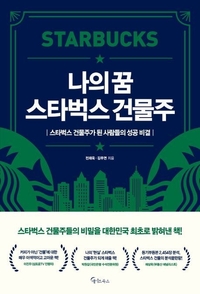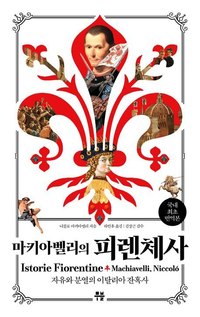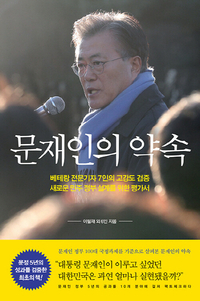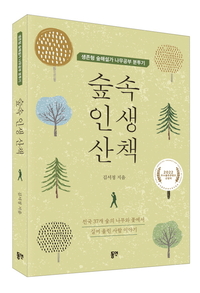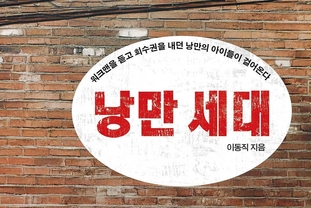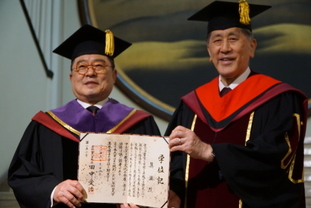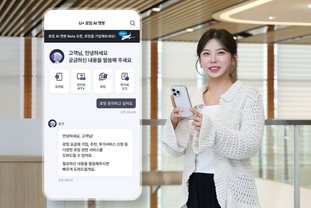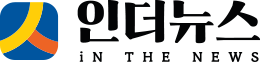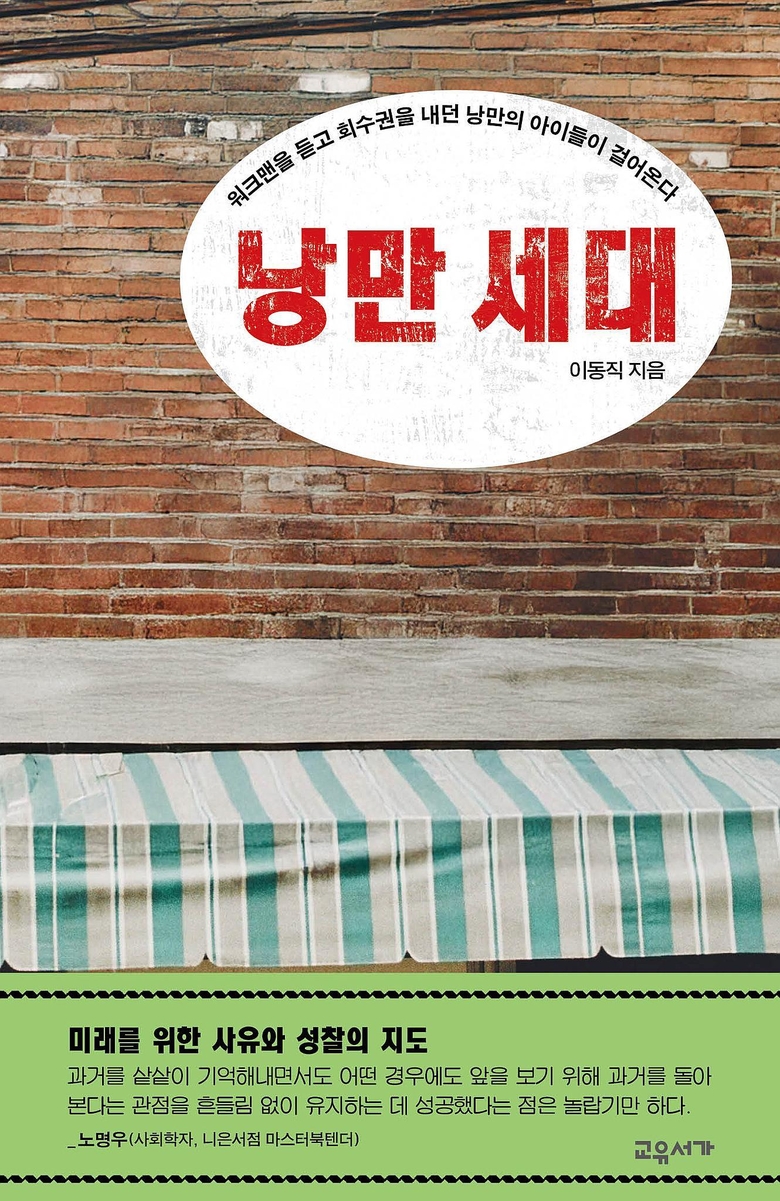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0세기 후반에 태어나 청년의 나이로 21세기를 맞이한 사람들. 낭만 세대는 두 가지 높다란 경계를 넘어야만 했다. 하나는 시대의 경계였고, 다른 하나는 삶의 경계였다.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개인의 삶을 준비해야 했다."
저자는 1971년 생임을 강조합니다. 1971년은 인구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정점이었던 해입니다. 통상 1964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라 칭하는 데 1971년에는 출생아 수가 102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입니다.
'낭만 세대'는 현재 50대를 중반 전후를 주축으로 하는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아우르는 신조어입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에서 태어나 '잘 살아보자'고 새벽종이 울렸던 새벽에 일을 나가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80년대 민주화운동과 88서울 올림픽의 이항적 세계관 속에서 십대를 보냈습니다. IMF의 혼란속에 사회에 나와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격변하는 시절을 관통하며 어느덧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기득권' 세대가 되었습니다.
책은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감한 감상들을 묶어 쓴 소위 '후기 2차 베이비부머세대'의 자술서입니다. 정교하고 학술적인 논증보다는 미디어나 사회학적 분석의 틀로 다소 감성적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들 세대의 정체성을 구체화 합니다. 이를 위해 포섭한 개념이 '낭만' 입니다.
그 과정에서 "낭만 세대는 능력 중심 사회에서 세습 사회를 만들어 낸 마법 같은 시절을 지나왔다"고 지난 50여년을 정의하며 그 과정에서 빚어진 세대 갈등을 우려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나무'가 될 것인지 자문합니다.
저자는 부모 세대는 삶이 빈곤한 생존의 세대였고 본인들의 자식 세대는 희망이 빈곤한 생존의 시대라고 일갈합니다. 그 중간에 ‘낭만 세대’인 자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다시금 자신들의 시대적 사명을 ‘낭만’에 빗대어 소환합니다.
"낭만은 비현실적 질문으로 본질을 찾으려는 태도다. 질문을 시작한다. 공존의 상상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질문 자체를 던지는 스스로의 모습들에 도취될지, 아니면 그 질문의 답을 듣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달리 권위주의와 아집을 내려놓고 철든 어른으로서 지금과 다른 ‘노년 세대’를 보여줄지는 전적으로 '낭만 세대'들의 몫일 것 입니다.